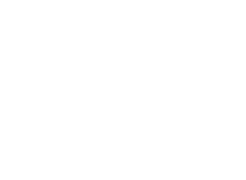MAGAZINE / LIFESTYLE
2021. 10. 26
화가의
눈으로 본 가을
눈으로 본 가을
가을의 별명 상자

별명이란 어떤 대상에게서 느끼는 가장 강력한 인상이다.
눈이 크면 왕눈이, 키가 훤칠하면 전봇대, 무서우면 호랑이 등 누군가의 외모, 말투·행동·성격이 그 사람을 대표하는 고유명사가 된다. 사실적이고 추상적인 특징을 언어화하는 별명의 메커니즘.
그렇다면 화가의 눈으로 본 가을은 어떤 모습일까?
그들이 가을에 붙이는 별명은 어떤 모양과 색을 지녔을까?
우리 머릿속에 있는 별명 상자에 ‘가을’과 ‘그림’이라는 키워드를 입력하고 함께 결과 버튼을 눌러보자.
눈이 크면 왕눈이, 키가 훤칠하면 전봇대, 무서우면 호랑이 등 누군가의 외모, 말투·행동·성격이 그 사람을 대표하는 고유명사가 된다. 사실적이고 추상적인 특징을 언어화하는 별명의 메커니즘.
그렇다면 화가의 눈으로 본 가을은 어떤 모습일까?
그들이 가을에 붙이는 별명은 어떤 모양과 색을 지녔을까?
우리 머릿속에 있는 별명 상자에 ‘가을’과 ‘그림’이라는 키워드를 입력하고 함께 결과 버튼을 눌러보자.
피부가 푸석푸석한 1857년 어느 가을날, 가난한 시골 농가에서 태어난 장 프랑수아 밀레Jean-François Millet, 1814~1875는 마을을 거닐던 중 이삭 줍는 세 여인을 발견하고 ‘이삭 줍는 여인들’(1857)을 그린다. 허름한 옷을 입고 허리 한 번 펴지 못한 채 땅바닥에 떨어진 밀 이삭 줍기에 몰두하는 여인들. 탐스럽게 익은 곡식은 농장주가 전부 추수해가고, 이들에게는 들판에 남은 자잘한 이삭을 줍는 것만 겨우 허가될 따름이다. 그림 상단의 오른쪽, 멀찍이 떨어져 말을 타고 여인들을 감시하는 보안관 모습은 가난한 서민의 눈칫밥 현실을 더욱 안쓰럽게 만든다. 밀레에게 가을은 사색과 감상에 취하기보다 혹독한 겨울을 준비하는 고비의 계절이었을 터. 그는 가을에 연민이라는 이름표를 달아줬다.

카지미르 세베르노비치 말레비치의 ‘추수하는 사람’.
그로부터 55년 뒤인 1912년의 또 어느 가을날, 카지미르 세베르노비치 말레비치Kazimir Severinovich Malevich, 1878~1935 역시 농가를 산책하다 수확에 열중하는 노동자를 만나 ‘추수하는 사람’(1912)을 캔버스에 담아낸다. 그도 밀레와 마찬가지로 가슴 한편이 찌릿찌릿 아려왔을지···. 그러나 말레비치는 반짝이는 눈으로 환호한다. “수그린 인체가 재밌게 생겼네!” 밀레가 금방이라도 움직일듯한 세밀한 묘사로 농민의 고단한 삶을 재현했다면, 말레비치는 추수하는 몸짓에서 드러나는 덩어리감과 가을 특유의 색감에 더욱 집중했다. 동일한 현상을 보더라도 누군가에게는 망막에 맺힌 형태 자체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 너머의 현실이 중요한 것이다.

빈센트 반 고흐의 ‘알리스캉의 가로수길.
빈센트 반 고흐Vincent van Gogh, 1853~1890는 친구 고갱과 함께 프랑스 남부 마을 아를을 여행하면서 ‘알리스캉의 가로수길’(1888)을 그렸다. 알리스캉은 아를에 보존된 로마 유적으로, 길가에 늘어선 포플러나무가 매력적인 명소다. 아직 여름 풋내가 덜 가셨는지 곳곳에 남은 초록 흔적과 촛불처럼 피어오르는 단풍이 조화를 이루는 풍경. 고흐의 그림은 들뜬 여행길에 그렸음에도 어딘지 쓸쓸한 냄새가 난다. 지금의 우리는 모두 알지만, 당시 고흐가 몰랐던 고흐의 미래는 낙엽 지는 포플러 나무와 닮은 구석이 있다. 유적을 그린 그림도, 그의 삶도 이제는 전부 유적이 됐다.

바실리 칸딘스키의 ‘바바리아의 가을’.
한편 추상화의 선구자 바실리 칸딘스키Wassily Kandinsky, 1866~1944도 가을 나무를 그렸다. 또렷한 원근법으로 구도가 안정적인 고흐 그림과 달리 ‘바바리아의 가을’(1908)은 훨씬 평면적이다. 화면 가운데 건물로 이어지는 길보다 좌측의 나무와 그림자 얼룩이 더 눈길을 잡아끈다. 고흐 그림의 주제가 여행과 유적지 정경인 반면, 칸딘스키는 가을 길에서 얻은 주관적 인상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방법을 고심했다. 우리는 그림자를 검은색으로 쉽게 ‘퉁’치지만, 빛의 각도와 대상의 두께에 따라 그림자는 방대한 스펙트럼의 채도와 명도를 지닌다. 그러기에 그림자를 푸른색으로 처리한 칸딘스키 그림은 우리에게 현실감과 기시감을 동시에 부여한다.
한 번도 가본 적 없지만 언젠가 가본 것 같은 느낌, 화가와 관객은 그 느낌을 공유하면서 그림으로 연결되는 공동체를 이룬다.
한 번도 가본 적 없지만 언젠가 가본 것 같은 느낌, 화가와 관객은 그 느낌을 공유하면서 그림으로 연결되는 공동체를 이룬다.

폴 세잔의 ‘사과와 배가 있는 정물’.
차려진 상을 받는 이에겐 폴 세잔Paul Cézanne, 1839~1906의 ‘사과와 배가 있는 정물’(1871)처럼 먹음직스러운 과일이, 상을 차려야 하는 이에겐 르네 마그리트René Magritte, 1898~1967의 ‘리스닝룸’(1952)과 같이 속이 꽉 막히는 부담스러운 과일이 되기도 한다.
세잔은 “나는 사과 한 알로 파리를 정복할 것”이라고 선언했고 자신의 말대로 현대미술의 아버지가 됐지만,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50세가 될 때까지 무능한 아들, 실패한 화가로 은둔 생활을 했고,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화풍을 꿋꿋이 밀고 나간 끝에 56세가 되어서야 무명 타이틀을 벗었다. 초현실주의의 대가 마그리트는 또 어떤가. 단순하고 귀여운 형태로 대중의 인기를 끈 마그리트의 그림에는 그 무엇보다 암울한 배경이 깔려있다. 그는 약소국 벨기에 국민으로서 1·2차 세계대전을 몸소 겪은 것은 물론, 14세의 어린 나이에 어머니의 자살까지 경험했다. 남들과 다른 시각으로 세계를 해석하는 눈은 거저 얻는 게 아닌 것인지….
사과는 어디에나 있는 과일이지만, 아담과 이브의 선악과, 뉴턴의 사과, 애플의 사과처럼 때로는 인류의 역사를 통째로 바꿔놓는다. 마찬가지로 세상에는 수많은 화가가 존재하지만, 그중 어떤 화가는 미술사를 완전히 뒤흔들어놓는다. 그 흔해빠진 사과 한 알로 말이다.
세잔은 “나는 사과 한 알로 파리를 정복할 것”이라고 선언했고 자신의 말대로 현대미술의 아버지가 됐지만,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50세가 될 때까지 무능한 아들, 실패한 화가로 은둔 생활을 했고,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화풍을 꿋꿋이 밀고 나간 끝에 56세가 되어서야 무명 타이틀을 벗었다. 초현실주의의 대가 마그리트는 또 어떤가. 단순하고 귀여운 형태로 대중의 인기를 끈 마그리트의 그림에는 그 무엇보다 암울한 배경이 깔려있다. 그는 약소국 벨기에 국민으로서 1·2차 세계대전을 몸소 겪은 것은 물론, 14세의 어린 나이에 어머니의 자살까지 경험했다. 남들과 다른 시각으로 세계를 해석하는 눈은 거저 얻는 게 아닌 것인지….
사과는 어디에나 있는 과일이지만, 아담과 이브의 선악과, 뉴턴의 사과, 애플의 사과처럼 때로는 인류의 역사를 통째로 바꿔놓는다. 마찬가지로 세상에는 수많은 화가가 존재하지만, 그중 어떤 화가는 미술사를 완전히 뒤흔들어놓는다. 그 흔해빠진 사과 한 알로 말이다.

폴르네 마그리트의 ‘리스닝룸’.
여름의 끝이 찾아오면 나무의 마음도 싱숭생숭하다. 나무는 기분을 전환할 겸 머리를 염색한다. 빨강, 주황, 노랑, 고동 등 각자의 성향에 따라 물들인 나뭇잎이 아스팔트에 뚝 떨어지면 사람은 그중 상처가 덜한 놈을 주워 책에 끼워두기도 한다. 시간이 흘러 책에서 발견되는 것은 죽은 나뭇잎이 아니라 그때의 싱숭생숭한 내 마음이다. 그렇다면 화가는 가을의 어떤 마음을 캔버스에 끼워 넣을까?

클로드 모네의 ‘아르장퇴유의 가을’.
클로드 모네Claude Monet, 1840~1926와 조지아 오키프Georgia O'Keeffe, 1887~1986는 강가로 나선다. 먼저 모네는 빛을 본다. 청명한 가을 하늘과 구름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 강물에 반사되는 지상 풍경이 모네의 화폭에 담긴다. 화면을 수평으로 나눠 대칭으로 펼쳐지는 세계는 캔버스를 뚫고 현실로 나아갈 것만 같은데, 마치 한 장의 사진을 찍듯 눈앞에 나타난 순간을 정직하게 표현했다.
그와 비교했을 때 오키프의 가을은 무서울 정도로 환상적이다. 모네의 ‘아르장퇴유의 가을’(1873)이 DSLR 촬영본이라면, 오키프의 그림은 필름 카메라로 찍은 사진 같다고 할까. 작품명이 ‘조지 호수의 가을’(1927)보다 ‘조지 호수의 산불’이 더 어울릴 법한 이 그림은 하지만 가을의 정점에 치달은 자연을 더욱더 깊은 울림으로 제시한다. 비교하자면 모네의 가을은 우리에게 익숙한 계절을, 오키프는 자신이추억하는 계절을 그려냈다고 볼 수 있다.
인간의 감정은 가을 나뭇잎과 같아서 푸르다가도 금세 붉어지고, 시들며 낙하하기도 한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상처가 아문 자리에는 반드시 새잎이 돋아난다. 추억은 추상화다. 우리는 그곳에서 남들이 보지 못한 장면을 발견하기도 하고, 낯선 감정을 느끼며 회상에 잠기기도 한다. 화가가 붙인 가을의 별명을 따라 불러보기도 하고, 나만 아는 이름으로 슬쩍 바꿔 불러보기도 한다.
그와 비교했을 때 오키프의 가을은 무서울 정도로 환상적이다. 모네의 ‘아르장퇴유의 가을’(1873)이 DSLR 촬영본이라면, 오키프의 그림은 필름 카메라로 찍은 사진 같다고 할까. 작품명이 ‘조지 호수의 가을’(1927)보다 ‘조지 호수의 산불’이 더 어울릴 법한 이 그림은 하지만 가을의 정점에 치달은 자연을 더욱더 깊은 울림으로 제시한다. 비교하자면 모네의 가을은 우리에게 익숙한 계절을, 오키프는 자신이추억하는 계절을 그려냈다고 볼 수 있다.
인간의 감정은 가을 나뭇잎과 같아서 푸르다가도 금세 붉어지고, 시들며 낙하하기도 한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상처가 아문 자리에는 반드시 새잎이 돋아난다. 추억은 추상화다. 우리는 그곳에서 남들이 보지 못한 장면을 발견하기도 하고, 낯선 감정을 느끼며 회상에 잠기기도 한다. 화가가 붙인 가을의 별명을 따라 불러보기도 하고, 나만 아는 이름으로 슬쩍 바꿔 불러보기도 한다.

조지아 오키프의 ‘조지 호수의 가을’.
글. 이현(<아트인컬처> 수석기자)